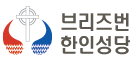기쁨과 슬픔이 씨줄과 날줄로 만나는 곳, 희망과 번뇌가 산소와 수소처럼 결합되어 있는 곳, 그곳은 우리 자신
이며 동시에 세상입니다. 그래서 슬픔에서 기쁨을 기다리는 인내와 용기가, 희망에서 번뇌를 준비하는 지혜와 겸손이 값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를 묵상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축제의 들뜬 분위기나 잡히시기 전의 불안하고 두려운 분위기는 읽을 수 없고,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담담
합니다. 아버지께 가실 때가 왔음을 아신 예수님이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편에서 그때가 임박하자 제자들이 산란해질까 봐, 겁을 낼까 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며 다독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 일”이 닥치자 제자들은 실제로 산란해졌고, 겁을 내며 달아났으며, 무서움에 문을 잠그고
숨어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께 가신” “그 일”이 제자들에게는 그저 끔찍한 ‘십자가 처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하느님 아버지와 세상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목숨까지 내어 놓으신 스승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로 완전히변했습니다. 물론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날 저녁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와 “모세의 관습” 같은 인간의 능력으로 쟁취하려는
구원, 곧 세상이 주는 평화가 혼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평화가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평화를 가리거나 우리를 미혹(迷惑)하기까지 합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기에 충분할정도로 불의가 위세를 떨칠 때도 있고, 착각하고 속을 만큼 거짓평화가 그럴듯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환난을 겪으며 인내하면서도(묵시 1,9 참조) “전능하신 주하느님과 어린양이 도성의 성전”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믿고 희망하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만으로 ‘화려한 도성 예루살렘’을 쌓으려니 불안과 부조리와 불의에 시달리며 고통과 슬픔과 번뇌의 늪에 빠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우외환의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도들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과 … 결정하였습니다.” 성령과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서 새 하늘을 바라보고, 새 땅을 밟는 길입니다.
안팎의 내 처지(處地)와 주변(周邊)과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봅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만 옮깁시다. 성령께서 함께하십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맞갖은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신수동성당 주임
이며 동시에 세상입니다. 그래서 슬픔에서 기쁨을 기다리는 인내와 용기가, 희망에서 번뇌를 준비하는 지혜와 겸손이 값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를 묵상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축제의 들뜬 분위기나 잡히시기 전의 불안하고 두려운 분위기는 읽을 수 없고,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담담
합니다. 아버지께 가실 때가 왔음을 아신 예수님이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편에서 그때가 임박하자 제자들이 산란해질까 봐, 겁을 낼까 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며 다독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 일”이 닥치자 제자들은 실제로 산란해졌고, 겁을 내며 달아났으며, 무서움에 문을 잠그고
숨어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께 가신” “그 일”이 제자들에게는 그저 끔찍한 ‘십자가 처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하느님 아버지와 세상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목숨까지 내어 놓으신 스승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로 완전히변했습니다. 물론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날 저녁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와 “모세의 관습” 같은 인간의 능력으로 쟁취하려는
구원, 곧 세상이 주는 평화가 혼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평화가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평화를 가리거나 우리를 미혹(迷惑)하기까지 합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기에 충분할정도로 불의가 위세를 떨칠 때도 있고, 착각하고 속을 만큼 거짓평화가 그럴듯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환난을 겪으며 인내하면서도(묵시 1,9 참조) “전능하신 주하느님과 어린양이 도성의 성전”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믿고 희망하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만으로 ‘화려한 도성 예루살렘’을 쌓으려니 불안과 부조리와 불의에 시달리며 고통과 슬픔과 번뇌의 늪에 빠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우외환의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도들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과 … 결정하였습니다.” 성령과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서 새 하늘을 바라보고, 새 땅을 밟는 길입니다.
안팎의 내 처지(處地)와 주변(周邊)과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봅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만 옮깁시다. 성령께서 함께하십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맞갖은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신수동성당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