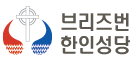“지금 우리가 봉헌하는 이 미사는 첫 미사요, 마지막 미사이며, 그래서 단 한 번의 고유한 미사입니다.” 꽤 오
래전 영어를 못해 서럽고 힘들던 시절, 지금도 정신을 번쩍 들게 한 어느 미국 신부님의 강론 구절이었습니다. 어찌 미사뿐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 내 머리와 마음에 떠오른 그 모든 감정과 생각들, 그 어느 것 하나 그 자체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단 한 번의 그것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씀은 귓가에 맴돌고, 그때마다 삶을 추스릅니다.
기쁨에 사로잡힐 때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슬픔과 분노에 안절부절못할 때 조용히 눈을 감게 합니다. 주제 모르고 고개 뻣뻣이 세우려 할 때 사방을 둘러보게 하고, 사방팔방 벽에 갇혔을 때 꺾인 무릎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한마디로 어둠에서도 눈을 떠 있게 하고, 빛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게 하여, 늘 저를 깨어 있게 해주는 셈입니다.
어김없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눈길을 걸을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마라. 내가 걷는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길잡
이가 될 것이니라.” 한 서산대사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나 자신, 내 머리와 마음과 영혼 그 안의 모든 것, 내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빠짐없이 귀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느 처지에도,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삶은 두렵고 거룩합니다.
곳곳에 하느님 흔적이 없는 곳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어찌 개인의 삶에만 한정하겠습니까? 한 공동체, 사
회, 민족, 더 나아가 인류의 행적(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독서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을 기억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억압에서 해방으로… 당신 백성
에게 그 일을 펼치신 하느님의 수고가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을 가르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양 떼”인 당신 제자들에게 어둠의 밤에도 깨어 있으라고, 그것도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십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 다고 그리스도 신앙인의 자세를 권고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삶을 꾸려갈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도 삶도 모두 하느님의 것이며, 하느님께서 그 세상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찌 어느 한 집사만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했겠습니까? 역사는 한 사회와 집단,
민족과 공동체가 그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와 집단, 민족과 공동체를 노골적으로 혹은 대놓고 핍박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핍박을 경쟁 혹은 적자생존의 이치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또 어찌 사람에 대해서만 그리했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산과 강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무수한 생명체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마치 우리 인간의 것인 양 허리띠를 풀어놓고 맘껏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해 때리지 않았습니까? 저급한 탐욕을 채우는 그것을 행복이라 그럴듯하게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사회와 공동체와 인류는 등불을 밝히고 있는지, 술 취해 있는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셈을 하자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신수동성당 주임
래전 영어를 못해 서럽고 힘들던 시절, 지금도 정신을 번쩍 들게 한 어느 미국 신부님의 강론 구절이었습니다. 어찌 미사뿐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 내 머리와 마음에 떠오른 그 모든 감정과 생각들, 그 어느 것 하나 그 자체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단 한 번의 그것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씀은 귓가에 맴돌고, 그때마다 삶을 추스릅니다.
기쁨에 사로잡힐 때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슬픔과 분노에 안절부절못할 때 조용히 눈을 감게 합니다. 주제 모르고 고개 뻣뻣이 세우려 할 때 사방을 둘러보게 하고, 사방팔방 벽에 갇혔을 때 꺾인 무릎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한마디로 어둠에서도 눈을 떠 있게 하고, 빛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게 하여, 늘 저를 깨어 있게 해주는 셈입니다.
어김없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눈길을 걸을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마라. 내가 걷는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길잡
이가 될 것이니라.” 한 서산대사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나 자신, 내 머리와 마음과 영혼 그 안의 모든 것, 내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빠짐없이 귀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느 처지에도,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삶은 두렵고 거룩합니다.
곳곳에 하느님 흔적이 없는 곳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어찌 개인의 삶에만 한정하겠습니까? 한 공동체, 사
회, 민족, 더 나아가 인류의 행적(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독서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을 기억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억압에서 해방으로… 당신 백성
에게 그 일을 펼치신 하느님의 수고가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을 가르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양 떼”인 당신 제자들에게 어둠의 밤에도 깨어 있으라고, 그것도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십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 다고 그리스도 신앙인의 자세를 권고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삶을 꾸려갈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도 삶도 모두 하느님의 것이며, 하느님께서 그 세상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찌 어느 한 집사만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했겠습니까? 역사는 한 사회와 집단,
민족과 공동체가 그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와 집단, 민족과 공동체를 노골적으로 혹은 대놓고 핍박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핍박을 경쟁 혹은 적자생존의 이치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또 어찌 사람에 대해서만 그리했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산과 강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무수한 생명체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마치 우리 인간의 것인 양 허리띠를 풀어놓고 맘껏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해 때리지 않았습니까? 저급한 탐욕을 채우는 그것을 행복이라 그럴듯하게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사회와 공동체와 인류는 등불을 밝히고 있는지, 술 취해 있는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셈을 하자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신수동성당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