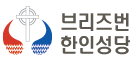프랑스의 소설가는 죽음에 대해 “우리가 인생을 통해 찾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른다. 이것뿐일지 도 모른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는 한량없는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무성한 잎을 떨구어 내고서야 비로소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겨울나무처럼 말입니다.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달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 생각해 보는 달이기도 합니다. 가면 놀이에 정신이 없었던 날들을 뒤로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죽음을 통해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 보고 살아갈 날들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해 보는 시간이 위령성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탈렌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종들을 불러 각자의 능력에 따라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나는 것에 비길 수 있습니다. 때가되어 주인은 종들과 셈을 합니다. 다섯 탈렌트로 다섯 탈렌트를, 두 탈렌트로 두 탈렌트를 더 번 종은 칭찬받지만 한 탈렌트를 그대로 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 버리고 맙니다. 하느님 나라는 자신의 몫에 충실한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삶이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부터 불행이 싹틉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아래를 보지 못하고 위만 바라보는 사람은 불만이 싹트고, 위를 보지 못하고 아래만 바라보는 사람은 오만이 자리하며, 밖에만 관심을 두다 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고요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아는 것과 자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씨앗을 자라게하는 지름길입니다.
예전에 심리공부를 할 때 담당 교수님은 제게 우울증같은 정신 질환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유는 자만심이 높아서라고…. 자만심은 자존심이나 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도를 뜻합니다. 물론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반듯이 좋은 조건 속에 살아온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란 주어진 조건이나 위치가 아니라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자기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정신없이 뛰어놀다 보면 어느새 북한산 너머로 저녁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굴뚝에 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아이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황홀한 고백처럼 들리던 그 시간, 홀로 남겨진 한 아이는 그렇게 지는 노을을 한참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윈 탓이었지만 그 홀로됨이 “아름다운이란 단지 고운 것이나 예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련함이고 아릿함”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애절하고 아릿한 그리움의 색채를 띠고 다가오듯이 삶은 그 어떤 순간에도 아름다운 빛깔로 자리할 수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에 대한 충실성을 담보하는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신도 주일입니다. 삶이 고달픔의 연속이고 힘겨움에 숨이 막히는 형국일지라도 아름다움이 아련한 그리움의 색채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고유한 색감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고유한 삶의 색감이야말로 그분을 마주할 때 보여줄수 있는 우리 삶의 충실성이 될 테니 말입니다.
권철호 다니엘 신부┃삼각지성당 주임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탈렌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종들을 불러 각자의 능력에 따라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나는 것에 비길 수 있습니다. 때가되어 주인은 종들과 셈을 합니다. 다섯 탈렌트로 다섯 탈렌트를, 두 탈렌트로 두 탈렌트를 더 번 종은 칭찬받지만 한 탈렌트를 그대로 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 버리고 맙니다. 하느님 나라는 자신의 몫에 충실한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삶이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부터 불행이 싹틉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아래를 보지 못하고 위만 바라보는 사람은 불만이 싹트고, 위를 보지 못하고 아래만 바라보는 사람은 오만이 자리하며, 밖에만 관심을 두다 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고요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아는 것과 자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씨앗을 자라게하는 지름길입니다.
예전에 심리공부를 할 때 담당 교수님은 제게 우울증같은 정신 질환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유는 자만심이 높아서라고…. 자만심은 자존심이나 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도를 뜻합니다. 물론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반듯이 좋은 조건 속에 살아온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란 주어진 조건이나 위치가 아니라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자기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정신없이 뛰어놀다 보면 어느새 북한산 너머로 저녁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굴뚝에 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아이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황홀한 고백처럼 들리던 그 시간, 홀로 남겨진 한 아이는 그렇게 지는 노을을 한참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윈 탓이었지만 그 홀로됨이 “아름다운이란 단지 고운 것이나 예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련함이고 아릿함”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애절하고 아릿한 그리움의 색채를 띠고 다가오듯이 삶은 그 어떤 순간에도 아름다운 빛깔로 자리할 수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에 대한 충실성을 담보하는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신도 주일입니다. 삶이 고달픔의 연속이고 힘겨움에 숨이 막히는 형국일지라도 아름다움이 아련한 그리움의 색채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고유한 색감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고유한 삶의 색감이야말로 그분을 마주할 때 보여줄수 있는 우리 삶의 충실성이 될 테니 말입니다.
권철호 다니엘 신부┃삼각지성당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