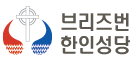어느날 한 맹인이 등불을 켜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자신은 비록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이 들고 있는 등불의 빛을 보고 자신과 부딪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등불을 들고 한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만 “탁!”하고 이 맹인과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화를 버럭 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눈도 없소? 나는 맹인이라 앞을 못보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도 보지 못하시오?” 그러자 맹인과 부딪친 사람은 어둠 속에서 손으로 맹인이 들고 있는 등불을 확인하고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이 먼 병자를 고쳐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기고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땅히 지켜야할 안식일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는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마저 부정하려고 듭니다. 그러면서 아예 예수님과 눈멀었던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세웁니다. 마치 위의 이야기처럼 등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모르는 소경이 자신과 부딪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볼 수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태생 소경이 분명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아니라 안식일 계명을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진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태생 소경은 비록 아무 것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빛이요 구원 그 자체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심지어는 회당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여러 소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만 소경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은 돈만 보이고, 도박에 미친 사람은 화투장만 보일 것입니다. 또 여자에 미친 사람은 여자만 보이고, 권력에 미친 사람은 권력만 보일 것입니다. 그렇듯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소경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요한 9,41).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오늘 복음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이 먼 병자를 고쳐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기고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땅히 지켜야할 안식일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는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마저 부정하려고 듭니다. 그러면서 아예 예수님과 눈멀었던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세웁니다. 마치 위의 이야기처럼 등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모르는 소경이 자신과 부딪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볼 수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태생 소경이 분명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아니라 안식일 계명을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진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태생 소경은 비록 아무 것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빛이요 구원 그 자체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심지어는 회당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여러 소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만 소경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은 돈만 보이고, 도박에 미친 사람은 화투장만 보일 것입니다. 또 여자에 미친 사람은 여자만 보이고, 권력에 미친 사람은 권력만 보일 것입니다. 그렇듯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소경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요한 9,41).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